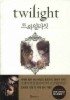| |||||||||||
영화를 먼저 보고나서 읽게 된 트와일라잇 소설.
소설을 먼저 읽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설이 더 좋았다고 하기에,
영화를 흡족하게 본 나는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불편해져선,
책을 사놓고도 한참을 비닐포장조차 뜯지 않고 그냥 꽂아만 놓았었다.
사랑스런 도서관 고양이 '듀이'와 감성적인 타블로의 '당신의 조각들'을 다 읽고 나선,
나는 또 트와일라잇을 피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을 집어들었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건 '타나토노트'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였는데,
심지어 그 사이에 소설이 한편 더 있었다고 머릿말에 써있는게 아닌가-.
첫번째 조각은 흐릿해지고, 두번째 조각은 빠진채로, 세번째 조각을 읽을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트와일라잇을 집어들었다.
메인 스토리는 (순서는 조금 바뀐 것들도 있었지만) 영화와 거의 유사했고,
영화에선 생략해버린 수많은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트와일라잇에 제대로 빠져버렸나보다.
결국 몇일도 못가서, 트와일라잇을 다 읽어버렸으니까.
| |||||||||||
그렇게 트와일라잇 2부인 '뉴문'을 읽기 시작한게 어제 아침이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혔다.
어설프게나마 어디선가 줏어들은 2부, 3부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적으론 어떻게 전개될지도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2부의 초반 스토리가 몹시, 극도로 싫었다.
그럼에도 나는 엄청나게 몰입해서 계속 '뉴문'을 읽고 있었다.
마치 영화 '잉크하트'처럼 책 속으로 들어가버리기라도 할듯이.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싫었던' 것 뿐이니까..
그래서 결국, 600페이지가 넘는 '뉴문'을 하루만에 다 읽어버렸다.
극도로 싫었던 초반 스토리가 어떻게든 결론이 나는걸 읽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덕분에 난 1시가 훌쩍 넘어서야 잠을 잘 수 있었다.
(요즘 난 5시반에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12시 전엔 잠을 잔다)
| |||||||||||
오늘 아침엔 조금은 긴장되고 두근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3부 '이클립스'를 들고 나왔다.
왠지 '이클립스'도 엄청난 몰입과 속도로 읽게될 것만 같았고,
'뉴문'처럼 또 오늘안에 한권을 다 읽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읽어야 할 4부 '브레이킹 던'이 내 손에 없기 때문이다. (!!!)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브레이킹 던'을 검색해보 았는데
대부분의 검색결과를 읽을 수가 없었다.
국내에는 아직 번역판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원문으로 읽은 사람들이
감상을 가장한 스포일러를 잔뜩 올려놓았기 때문이었다.
트와일라잇 시리즈 소설은... 사실 원래대로라면 내 취향의 소설은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체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스토리도 아니다.
아마도 난... 영화 속 멋진 에드워드의 모습에 현혹되고,
주인공 벨라에게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에드워드에게 현혹되어 벗어날 수 없게 된 벨라처럼,
이 소설에 현혹되어 버린것 같다.
아마 한동안은.... 포크스에 있게 될 것 같다.